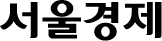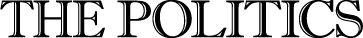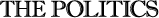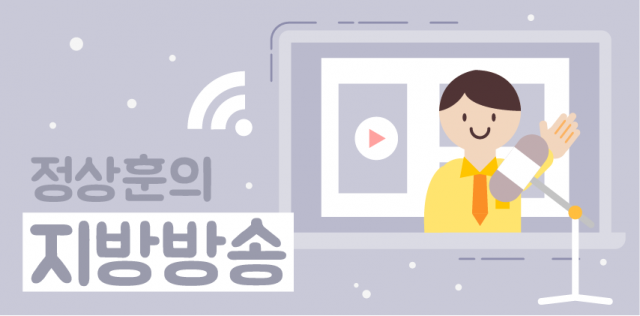‘조선의 4번타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은퇴했습니다.
지난 8일 롯데의 홈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선 이대호의 은퇴식과 동시에 그의 등번호 ‘10번’에 대한 영구결번식이 진행됐습니다.
사직구장에는 10번 이전에 2011년부터 영구결번으로 자리 잡고 있던 번호 ‘11번’이 있었습니다. 무쇠팔 최동원입니다.
YS 권유도 거절하고 지역주의 정면 돌파한 최동원
최동원 얘기를 정치 기사에서 하는 이유는 그가 1991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 이후 31년 만에 부활한 민선 지방선거, 최동원은 부산 서구 광역의원에 도전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동원이 소속된 정당이 ‘꼬마 민주당’으로 불렸던 민주당이었다는 점입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하며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이기택·노무현이 있던 그 민주당입니다.
당시 최동원의 경남고 선배였던 YS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를 민자당(민주자유당)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당 합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최동원은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강했던 시기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최동원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정치의 강속구’였습니다. 포스터 문구부터 디자인, 색상까지 최동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동원은 37.8%라는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최동원이 정치에 도전한 배경에는 1988년 선수협(프로야구선수협의회) 창단을 시도하려다 가로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과는 달리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후배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정치에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가 염원하던 선수협(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은 2000년 출범했지만, 최동원은 2011년 지병이던 대장암으로 53년의 강속구 인생을 마감합니다.
최동원 이후에도 이어진 선출 정치인…롱런은 드물어
운동선수 출신의 정치 도전은 최동원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선 금배지를 다는 데에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4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부의장이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회 직원들도 많아서 170㎝인 그의 신장에 놀라곤 합니다.
김 부의장은 1970년대 국가대표급 실력으로 무학여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농구선수였습니다. 김 부의장의 보좌진들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금도 두어 번의 연습만 거치면 3점슛을 클린샷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구선수로 성공을 거둔 이후 노동운동가를 거쳐 국무위원과 4선 의원까지 지낸 김 부의장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으로 꼽을 만합니다.
메달리스트 출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문대성 의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문 전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이에리사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70년대 세계선수권과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한 한국 탁구 레전드입니다.
21대 국회에선 김 부의장과 함께 ‘우생순’ 신화를 만들었던 임오경 민주당 의원(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996년 애틀란타·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과 한국 썰매 종목(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의 기반을 다진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인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입니다.
실패 사례도 없진 않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씨는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세계 바둑의 전설 조훈현 전 의원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체육계를 찾아 지지선언을 부탁하고 인재영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로 관심을 접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정치권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롱런에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치권이 체육계를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선 현역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감히 정면 돌파를 선택한 최동원의 정신이 그리운 이유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